“고대 중국을 조금 알고 나니 그에 버금가는 다른 문명의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첫 번째 포럼이 예정되어있는 고대문명연구소 홈피 내 소개의 서두에 쓴 말로, 이 연구소 설립에 대한 내 사적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조금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과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다.
이렇게 고대문명 비교연구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지만 내가 이 어려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혹시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관심 가지는 특정 분야에 대한 미세한 비교 정도에 그칠 것이다. 무엇보다 보편성을 지니는 거대담론이나 이론을 제시할만한 깜냥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시도 자체의 의의에 대해서도 이미 둔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 이 두 가지 핑계를 새삼 실감케 해준 좋은 책을 읽었다. 제임스 C. 스콧(전경훈 옮김)의 ❬농경의 배신: 길들이기, 정착생활, 국가의 기원에 대한 대항 서사❭(책과함께, 2019)다. 1936년생인 스콧은 2001년 예일대학에서 각 분야 최고 교수에게 주는 지위인 스털링 교수(Sterling Professor)에 올랐다. 80세가 넘은 2017년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의 책을 처음 접하며 위키피디아에 검색해보니 동남아시아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그의 연구는 주로 지배계층에 종속된 서발턴들이 그 지배에 대응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온 듯하다.
이 책 역시 제목 그대로 지배 담론에 대한 대항이라는 측면에서 이전 저작들과 그 궤를 같이한다. 다만 그 스스로 “무단 침입자가 쓴 정찰 보고서”(13쪽)라고 명시하듯, 고고학이나 인류학, 고대사라는 미지의 영역을 천착하여 농경에서 국가의 성립까지 기존의 인식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한다. 방대한 새로운 연구를 섭렵하며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그 학문의 폭과 깊이, 통찰력이 놀라울 뿐이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정착 생활과 함께 농경을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문명과 국가를 창출했다는 진보적 서사가 지금까지 우리 뇌리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 뒤에는 수렵 채집과 비정주(유목), 비국가(문명) 사회에 대한 폄하가 도사리고 있다. 스콧이 보기에 인류를 매료시킨 이러한 진보와 문명 서사는 위대한 농경 왕국들이 남긴 신화일 뿐이다. 현재까지 축적된 고고학 성과로 인해 상당 부분 폐기되어야 한다.
기원전 1만2천 년 이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고학 성과를 토대로 다른 고대문명의 양상까지 결합하여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 대부분은 인류가 식물과 동물을 길들여 기르게 된 것이 정착생활과 일정한 경작지에서의 농경으로 곧장 이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착생활은 식물과 동물을 기르게 된 것보다 훨씬 더 일찍이 시작되었다. 반면에 농사짓는 촌락들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정착생활과 식물·동물 길들이기 과정이 모두 완성되고도 4000년이나 지나서였다. 정착생활과 도시의 첫 등장은 관개시설과 국가가 성립된 데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하는 게 전형적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실 그 두 현상 모두 습지의 풍요로움이 낳은 결과임이 밝혀졌다. 정착생활과 경작이 직접 국가 형성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으나, 국가가 등장한 것은 일정한 경작지에서 농경이 시작되고 한참이 지난 뒤였다. 농경은 인류의 안녕, 영양섭취, 여가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도약을 이루었다고 생각되었으나 처음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국가와 초기 문명은 호사와 문화와 기회를 제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자석처럼 여겨져왔다. 초기 국가들은 그 주민 대부분을 속박했으며, 인구 과밀 상태에서 기인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도 잦았다. 또한 초기 국가들은 매우 취약했고 붕괴되기 쉬웠다. 이들 국가가 붕괴된 뒤에 이어진 이른바 ‘암흑기’에 인류 복지가 실제로 향상되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결국 국가 외부에서 살아가는 생활이―‘야만인’의 삶이―적어도 문명 내부에서 살아가는 비非지배계층의 생활보다 물질적으로 더 편안하고 자유로우며 건강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사실이다(16쪽)
스콧은 이미 개별 연구자들이 조각조각 제시한 내용들을 하나의 새로운 대항 서사로 요령 있게 엮고 있다. 위의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 제1장 불, 식물, 동물의 길들이기에서 제7장 야만인들의 황금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 분야를 조금 공부한 입장에서 그가 제시한 결론과 그 논증 과정이 기대했던 만큼 큰 감동을 준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그가 가끔씩 활용한 중국의 사례에서는 비전문가로서의 한계가 확실히 드러난다. 초기 정착 사회가 습지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그러한 도시들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전염병과 관련 있으리라는 추정은 중국의 신석기시대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가 초기 국가의 사례로 진시황의 진 제국을 든 것은 의아하게 느껴졌다. 이에 반해 고고학 자료가 상당해서 영문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 상 왕국의 사례를 거의 들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주지하다시피 진 제국은 16년 만에 멸망했어도 그 유산의 대부분은 한 제국으로 이어져 그 400년 동안 중국 문명이 정립되었다. 스콧이 고대 국가 취약성의 사례로 짧게 존속한 진의 경우를 든 것은 일부 타당하지만, 그 제국의 유산이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 최초의 고대국가로 인정되는 상의 경우는 왕조(대략 기원전 1600-1045년)로서 그 존속 기간만 보더라도 약 500년 정도로 상당히 안정된 토대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상에 뒤이은 서주 국가도 270년 이상 발전을 구가하여 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콧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서, 오히려 고대국가의 취약성이라는 자신의 이론에 반하는 이러한 사례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가 제시한 농경과 국가의 폐해를 통해서 볼 때 그의 반문명, 반진보 사관은 충분히 재고의 가치가 있어 보인다. 다만 그의 입장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정착과 농경이 결국 문명과 국가라는 문제 많은 제도를 산출해냈지만, 그것 역시 최소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 억압적 체제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더라도 인류가 이룩한 문명은 그 극심한 경쟁 시스템의 산물임을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의 주장처럼 이른바 야만인과 유목민이 그 당시에 더 행복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비문명, 비국가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
감히 최고 대가의 주장에 이설을 달며 고대문명 비교 연구의 어려움과 함께 크고 작은 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대담론과 이론의 역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래도 오늘 개시할 고대문명연구소가 우리들의 시야를 더 넓혀주리라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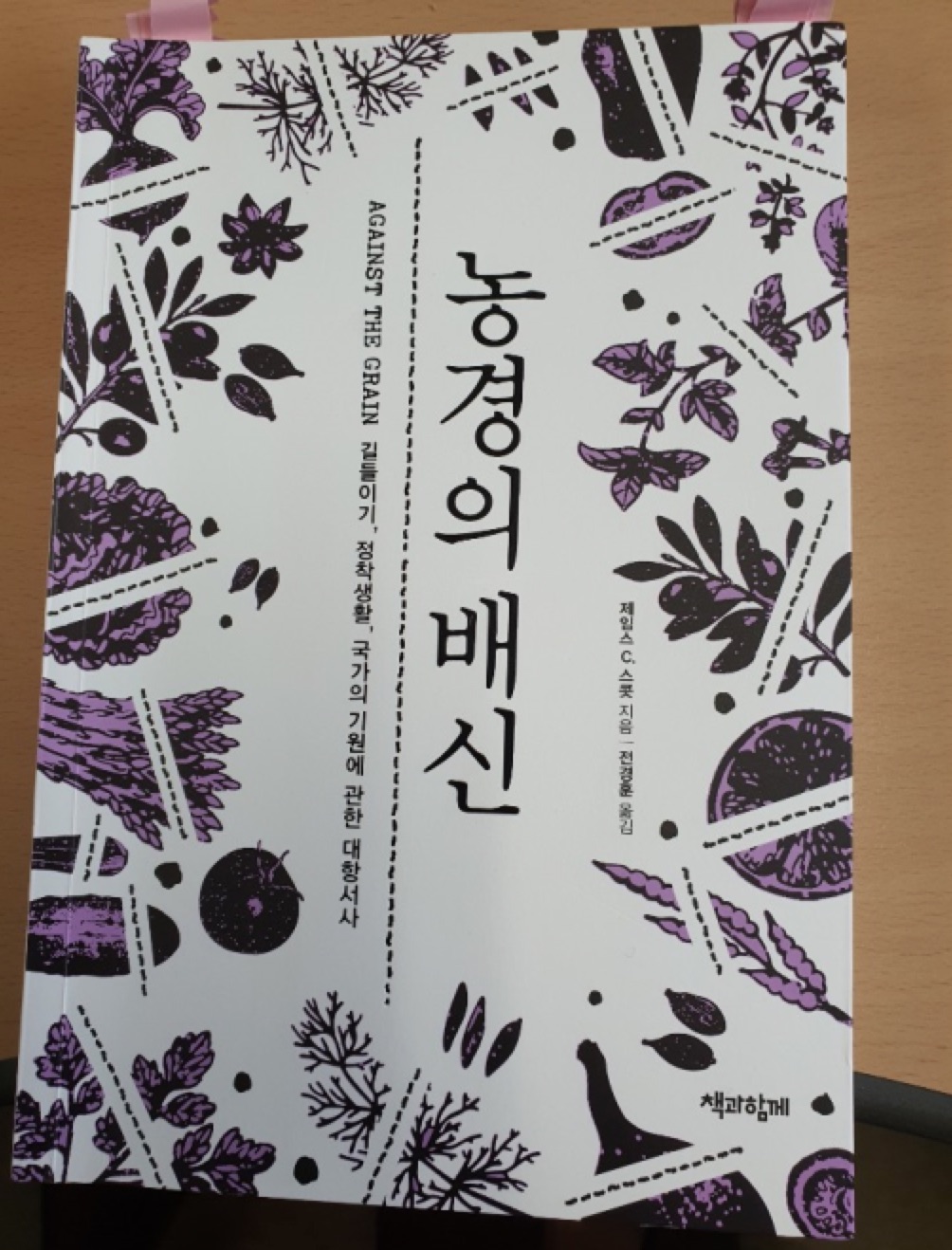
 9월 정기포럼 안내 ❬인더스 문명 연구 100년: 쟁점과 연구과제❭
9월 정기포럼 안내 ❬인더스 문명 연구 100년: 쟁점과 연구과제❭